내 안의 깊은 슬픔이 말을 걸 때
책 소개
애쓴 흔적, 풍경 속에 하나의 점처럼 앉아 있던 순간,
먼 시간 연기처럼 공중을 돌다 다시 내려와 앉은 풍경이 시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도 규정하지 않는다.
‘여자 사람’의 시
‘고즈넉하면서도 연둣빛 새살’ 같은 한순의 첫 시집이 출간되었다. 출판 편집자 경력이 거의 30년 되어 가는 54세에 내는 첫 시집이다. 편집자로, 아내로, 엄마로 그간 ‘마음이 흐르고 번지고 스며들어간 시간의 흔적’들을 오랜 시간 묵혔다가 시집으로 엮었다.
신경림 시인은 추천사에서,
한순의 시는 한 마디로 농익었다. 아무리 덮고 싸도 시에서 나는 짙은 향은 감추어지지 않는다. “저렇게 농익을 때까지 한자리에 얼마나 앉아 있었”<연잎 아래 감 두 알>을까 라는 탄식은 바로 자기 시를 나타내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그 짙은 향은 ‘향기롭다’라는 한 마디에 담아낼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소박한 내용의 것이 아니다. “새색시” 같은 맑고 깨끗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전쟁” 같은 파괴와 죽음이 있고, “미친년” 같은 광기와 혼돈이 있는가 하면 “지옥” 같은 원색의 절규가 있다. 그러나 한순의 시를 읽는 재미는 그것을 굳이 가리고 따지고 해가면서 읽는 데 있지 않다. 그 농익은 향을 가슴 깊이 마시면 된다. “저렇게 농익을 때까지” 한자리에 앉아 있었을 그 세월을 생각하면서.
‘농익은 향을 가슴 깊이 마시면 된다’고 시집 속에 고인 세월의 깊이를 눈여겨 봐주었다.
또한 시평에서 장석주 시인은 한순의 시를 “여자 사람”의 시라고 명명한다. 한순의 시에서 발견되는 ‘식물성 시학’은 평화주의적 공존에 가 닿는다고 표현한다. ‘한순은 그렇게 비문을 새기듯 한 자 한자를 적어나간 끝에 시를 완성’한다고 하면서 ‘그 일은 지난하지만 숭고하고, 그것을 쓰는 자에겐 지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여자 사람”은 “아들도 자고 남편도 자고 / 혼자 삶은 밤을 소리 없이 파먹”〈해독되지 않는 오후〉는다. 이 “여자 사람”은 혼자 목감기를 앓고, 혼자 고궁 나들이에 나서기도 한다. 자족적이고 자립적인 감정생활을 하는 여자라는 암시다. 이 자족과 자립의 근거는 ‘간격’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들 마음의 간격”〈카페와 큰 나무 사이〉이다. (……)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슬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자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는 “원색의 괴로운 파장”〈철쭉의 파장〉이 있다. 그 파장 때문에 “여자 사람”은 자주 흔들린다. 이 내면의 파장이 시를 낳게 했으리라. 그랬으니 제 영혼에 “말이 도착하는 순간 / [영혼이] 파장이 이는 수신기”로 바뀐다고 썼을 것이다.〈편집자 일기〉
“여자 사람”으로서의 우아함과 깊은 시선을 최윤 소설가도 포착하여 추천의 글에 이렇게 첨언하였다.
그 내적 풍경은 자연 속에서 조응을 찾는다. 자연은 그녀의 일부가 된다. 그것은 무슨 현학적인 시론, 아니, 어쩌면 가장 고매한 시론으로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삶과 자연이 만나는 사랑의 시론 말이다. 안타까움, 연민, 따사함, 안쓰러움, 결여, 스산함, 다시 안타까움…… 그 풍경들의 배후에서 울려나오는 것들은 이름은 다 달라도 사랑의 시선만이 포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성이 사그라들면서 삶 자체의 공허와 맞서는 여자! 그 여자의 무기는 물기이다. 한순의 시에서 식물과 자연을 응축하여 한 겹 더 내려가 보면, 그곳에는 생명의 원천인 물, 물 한 방울, 안개, 속눈썹을 적시는 물기 등 생명의 원천인 물을 정서의 배태인 용서, 화해, 생명의 응시로 나타낸다.
언제부터 증발한 것인지 / 드러나버린 바닥에 소리 없이 금 가 있다 / 생강꽃 필 때까지 / 기다린다더니 / 겨우내 참다가 실금을 남겼다 / 안전장치는 아무 소용이 없고 / 깊은 밤 홀로 깨어도 눈물은 나지 않는다 / 흐르는 계곡에게 물어도 / 젖무덤 같은 산봉우리를 안고 있는 하늘에 물어도 / 그들은 답하지 않기로 약속한 듯했다 / 산을 그 자리에 / 계곡을 제자리에 다시 앉혀놓고 / 올려다본 하늘 / 차갑지는 않았다 / 그제야 겨울을 그렁이던 한 방울 / 실금 타고 / 고인다
〈눈물에게〉 中에서
사랑과 연민의 시선으로 삶과 자연을 하나로 연결 짓고 빈속을 채우는 여자! 내면의 깊은 슬픔은 또 다른 정서적 배태이다.
흐르고 번지며 스며들어간 시간의 흔적들
신경림 시인은 그의 추천사에서 “한순의 시는 한 마디로 농익었다. 아무리 덮고 싸도 시에서 나는 짙은 향은 감추어지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시인은 하루하루 농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다. 기다리다 보면 돌이 자라는 것도 볼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때문이었을까.
몇 날 동안 시 한 편 못 쓴 것이 / 어찌 내 탓이랴 / 그건 팔랑이는 나비의 떨림, / 물결 져 흐르는 하얀 데이지의 출렁임 때문 / 단단한 아파트 창틀 너머 / 청태 묻은 흰 구름이 오가고 / 나는 얇은 옷을 입은 채 / 그들의 들고 남을 혼자 바라볼 뿐 / 시가 써지지 않는 밤 그들이 / 하릴없이 문 열어놓고 / 나를 바라보고 있었듯 / 그저 기다리는 밤이었듯 / 기다린다, / 돌이 자라기를 / 내 엄마의 엄마가 그랬듯이 <돌이 자란다>
한순의 시들을 읽으면 감정의 교감이 깊고 원활하며, 삶의 안팎을 살피는 지극한 시선이 엿보인다. 장석주 시인은 한순의 시에 대해 “슬픈 정념은 있지만 신파는 없다.”고 말하며 “(삶이라는) ‘아름다운 질병’을 향한 담담한 관조와 깊이를 낳는 시적 숙고만이 오롯할 뿐이”라고 말한다. “문질러지고, 헹구어지고, 봄볕에 말라 부서져 사라져가”〈비구상의 계절〉는 것들을 따라가며 펼치는 시적 사유가 놀라움을 자아내는 이유다.
이뿐인가? 시집에는 수식 없이 삶을 담담하게 성찰한 결과를 내보이는 〈흑백사진〉 같은 시들이 있는가 하면, 시인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 들꽃의 미약하면서도 끈질긴 숨결을 노래한 시들도 있다. 나이 지긋한 “여자 사람”에게 간혹 진득한 정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시인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짙은 향을 뿜어내니 매료될 수밖에 없다.
한순이 오십이 넘어서 펴낸 이 첫 시집은 “그 마음이 움직여 나아간 궤적들, 마음이 흐르고 번지고 스며들어간 시간의 흔적들”〈장석주 ‘해설’ 中에서〉을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시집 출간과 함께 한순의 첫 음반 《돌이 자란다》도 동시 발매되었다. 《내 안의 깊은 슬픔이 말을 걸 때》에 수록된 시에 멜로디를 얹은 노래들이다. 음반 전체에 연민, 사랑, 공감의 감정이 짙게 흐르는 게 이번 앨범의 특색인데, 편집자이자, 엄마, 아내, 딸의 감정들이 잘 스며 있다.
저자 및 역자 소개
목차
추천사
1장
겹꽃의 자락 / 해바라기 풍금 / 중심을 수선하고 / 깊은 산방 / 철쭉의 파장 / 카페와 큰 나무 사이 / 빗줄기 연꽃에 떨어질 때 / 말은 없었다 / 어떤 원시 / 막膜 / 연잎 아래 감 두 알 / 흑백사진 / 식물 띠 / 잠, 오래된 / 산목련 / 유리창 그림자 / 빌딩의 밤 / 봄의 등 / 해독되지 않는 오후 / 저문 비 / 달개비 / 봄비를 신고 / 눈물에게 / 처서處暑 / 별의 허물 / 허공이 자란다 / 가을 기억 / 오래된 습관 / 세모歲暮
2장
혹시 시 / 편집실 오후 / 편집자 일기 / 돌이 자란다 / 상추와 비 / 뜨끈한 싸움 / 듯 / 달의 무대 / 시인 1 / 시인 2 / 김치찌개 / 자꾸만 귀가 젖는다 / 투명 미장원 / 우수雨水 / 일상 소나타 / 토란잎에게 / 미니어처 / 개망초 1 / 개망초 2 / 낯설어지는 새벽 / 빈 달 / 느림 / 들켰다, 참새 떼
3장
하얀 새 / 빗소리 음愔 / 붉은 말 한 송이 / 백로白露 / 내 남자가 쉬고 있다 / 돌아온 꽃잎 / 도선사 / 같이 가자 / 아버지의 노을 / 비구상의 계절 / 개망초 3 / 꽤 쓸쓸한 깃털 / 살냄새 / 마루의 눈 / 형제 / 연둣빛 불안 / 경칩驚蟄 / 내 안에 남자 있다 / 울음의 법칙 / 마지막 달력을 뜯다
해설
책 속으로
<겹꾳의 자락>
저렇게 농익을 때까지 / 한자리에 얼마나 앉아 있었던 것인가 // 비명도 지나가고 / 한숨도 지나가고 // 너를 낳아준 어머니의 한숨이야 말할 것 없겠고 // 터질 것처럼 붉은 해 두 알 / 업보를 다 덮어줄 푸른 손바닥 // 때 된 것들의 만남 / 향기가 낭자하다
<연잎 아래 감 두 알>
1.
두 겹으로 보인 것은 다행이었다 / 깍두기를 항우울제처럼 / 입안에 넣는 여인 // 설렁탕, 해장국, 도가니탕 / 뭇매를 맞은 / 포유류의 살갗 같은 메뉴 / 미끄덩한 물기가 있는 곳으로 // 겹친 차가 후진을 하고 / 두 겹의 부부가 / 설렁탕집으로 들어간다 /
2.
나와 나 사이의 완충지대 / 저 투명한 막 // 그대와 나를 간신히 살려주는 / 저 얇은 막 // 아프다고 생각했다, / 맞닿을 수 없음이 // 문득 무서웠다, / 수면처럼 잔잔한 막 너머 / 저편 죽음 // 들여다보던 살이 살 속으로 / 아, 그 태초를 감싸는 양수의 / 막膜
<막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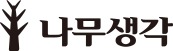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