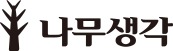나무가 열어주는 아침

몸에 좋은 감태
해조류 중에 감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해안에서 겨울철에 주로 채취하는 것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매 끼니 밥상에 올라오다 보니,
씁쓰레하지만 바다 내음 품은 시원한 그 맛이
어린 제 입맛에도 꽤 익숙해져서 자연스레 젓가락질을 하곤 했습니다.
감태는 말려서 간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민물에 씻어서 자박자박 소금 간을 하여 먹기도 합니다.
감태는 양식이 안 되는 것이라,
개를 트는 날 주민들이 갯벌에 가서 일일이 채취를 하는데,
딱 들고 올 수 있는 양만큼만 해옵니다.
설날에 고향에 내려갔더니 사립에 긴 빨랫줄을 쳐서 감태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집에 한 박스씩 다 싸 보내고 남은 것입니다.
두 주먹을 걷어다가 서울 사람들에게 주었더니
떡국에다 풀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어머니가 서울 사람들은
감태 먹을 줄도 모른다며 크게 웃었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보약이지.”
이러면서도 먹는 방법을 한참을 길게 설명합니다.
책을 만들면서도 우리 책이 어디로 갈까,
어떤 독자를 만날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우리 책을 맛있게 먹어줄까, 보약이 될까,
감태처럼 훗날에라도 몸에 좋은 것이라고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감태에 들러붙어 있는 티와 쩍을 세심히 골라내듯,
책을 만드는 데도 온 신경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정성스럽게 만든, 건강한 그 맛을 독자들이 기억하고
꼭 다시 찾으면 좋겠습니다.
양미애 글,사진